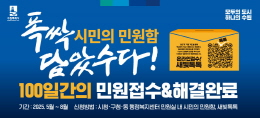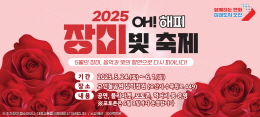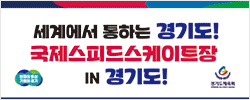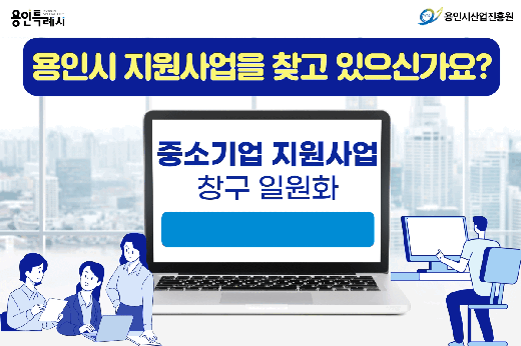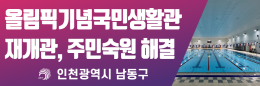(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경기도박물관은 조선 중기 대표적인 문신이자 문장가였던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후손이 〈김상용 초상〉과 선조어필(宣祖御筆) 〈청풍계(淸風溪)〉 현판 등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김상용의 후손인 김경일(김상용 16대손)이 선조들의 뜻을 기리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사회와 공유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루어졌다.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경택(景擇), 호는 선원(仙源), 풍계(楓溪) 등이다. 1582년 진사가 됐고, 1590년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여러 관직에 올랐다. 1598년에는 성절사(聖節使)로 북경에 다녀왔다. 인조반정 후에는 병조, 예조, 이조의 판서를 역임했으며, 1630년에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갔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원손을 수행하여 강화도에 피난했다가 성이 함락되자 순절했다.
조인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평가에 따르면 기증된 〈김상용 초상〉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앉아 있는 인물의 상반신만 그렸다. 머리에는 오사모(烏紗帽)를 썼는데, 양쪽 날개에는 칠보운문(七寶雲文)이 옅은 먹으로 그려져 있다. 모정(帽頂)은 낮은 편으로 당시의 복식을 따르고 있다. 관복은 시복(時服)이라고 불리는 둥근 깃의 분홍색 단령(團領)을 입었고, 허리에는 서대(犀帶)를 착용했다. 서대는 청색 띠에 가로로 네 줄을 긋고 네모나고 둥근 띠돈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얼굴의 이목구비는 갈색의 굵은 필선으로 그렸으며 뺨에는 부분적으로 어둡게 채색하여 음영효과를 냈다. 검은색과 흰색의 가는 필선으로 옆머리, 눈썹, 수염을 세밀하게 그렸다. 관복의 옷주름은 굵고 짙은 분홍색의 필선으로 묘사했는데 간결하고 힘찬 필세가 느껴지는 직선적인 표현이 강조됐다.
화면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선원노수시년육십팔(仙源老叟峕䄵六十八)”이라고 쓰고, “仙源”, “金尙容印”, “仁王山人”이란 세 개의 인장을 찍었다. 왼쪽 윗부분에는 “숭정원년무진이신흠사(崇禎元年戊辰李信欽寫)”라고 적었다. 이를 볼때 초상의 제작은 김상용의 나이 68세(1628년) 모습을 이신흠(李信欽, 1570-1631)이 그린 것이며, 글씨는 모두 김상용이 직접 쓴 것이다.
이 초상화를 그린 이신흠(李信欽, 1570-1631)은 화원으로 초상화를 매우 잘 그렸다. 특히 1590년 광국공신(匡國功臣)부터 1628년 영사공신(寧社功臣)까지 지속적으로 녹훈도감에 참여하여 “공신화상의 열에 아홉은 그의 손에서 나왔다”라는 평이 있을 정도였다.
화면 위쪽에는 별도의 비단에 찬문을 적었는데, 이는 1717년에 김상용의 증손자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이 화상찬을 짓고, 고손자인 김시보(金時保, 1658-1734)가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김창흡은 김상용의 동생인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증손자로 학문과 문장으로 유명했다. 이 찬문은 그의 문집인 삼연집(三淵集)에 「선원선생화창찬(仙源先生畵像贊)」으로 수록되어 있다. 김시보는 김상용의 둘째 아들인 김광현(金光炫, 1584-1647)의 증손자로 김창흡의 형인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이었으며, 시문에 뛰어나 김창흡의 총애를 받았다.
〈김상용 초상〉은 17세기 전반의 초상화 화풍을 잘 보여주며, 유명한 문신이었던 김상용의 모습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작품이기에 예술성과 역사성이 뛰어난 회화이며 문화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김상용 초상〉과 함께 기증된 선조어필(宣祖御筆) 〈청풍계(淸風溪)〉 현판은 단정한 해서(楷書)로 “청풍계” 세 글자를 새겼으며, 앞쪽에 “선묘어필(宣廟御筆, 선조의 어필)”, 뒤쪽에 “숭정계유간(崇禎癸酉刊, 숭정 계유년(1633년)에 새김)”이라는 글씨가 예서(隸書)로 새겨져 있다. 글씨는 모두 양각(陽刻)으로 새겨져 있다.
김민규 문화유산전문위원의 평가에 따르면 현판은 새겨진 바와 같이 선조가 쓴 “청풍계”라는 글씨를 쓴 것이며, 이 글씨를 받은 사람은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1561~1637)으로 추정된다. 김상용은 고조부인 김영수(金永銖, 1446~1502)가 터 잡아 산 곳이 인왕산 동쪽 능선으로 청풍계라고 불렀다.
『선원유고(仙源遺稿)』의 '선원선생연보(仙源先生年譜)'에는 1608년(선조41) 2월에 선조(宣祖)가 승하하고, 이 해에 김상용은 청풍계별업(淸風溪別業)을 조영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청풍계(靑楓溪)라고도 했다고 한다. 암(菴)의 이름을 와유(臥遊), 각(閣)의 이름을 청풍(淸風)이라고 지었으며, 연못(池), 대(臺), 바위(巖), 골짜기(壑)의 이름을 모두 지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김상용은 청풍(楓溪), 계옹(溪翁)이라는 호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김상용인 1608년에 청풍계를 지었으며, 선조는 1608년 2월에 승하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김상용의 청풍계 건축을 전해 들은 선조가 1608년 이전에 이 글씨를 써 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청풍계에는 태고정(太古亭), 늠연사(凜然祠), 청풍지각(淸風池閣)이 있었는데, 동야(東野) 김양근(金養根, 1734-1799)의 '풍계집승기(楓溪集勝記)'에는 청풍지각이 4칸의 마루와 2칸의 방이 있는 건물로 김상용의 거처라고 했으며, 이 건물의 들보 위에 선조 어필인 ‘청풍계’ 3자(三字)를 걸어 놓고 붉은 천으로 둘러놓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김상용이 거처한 청풍지각에 이 현판이 걸려있었고, 붉은 비단으로 둘러 놓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겸재(謙齋) 정선(鄭敾, 1676~1759)은 김상용과 김상헌의 후손들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모주(茅洲) 김시보(金時保) 등에게 학문 등을 배우고 친교를 맺어 청풍계를 여러 차례 그렸다. 그래서 청풍계 그림에는 청풍지각이 빠짐 없이 그려져 있는데, 이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청풍계 그림에 청풍지각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 ”형태의 건물이 청풍지각으로 앞쪽에 누마루, 왼쪽에 대청, 뒤쪽의 방 등 건물 형태가 김양근의 기록과 일치한다.
겸재 정선이 청풍계를 다수의 작품으로 그린 것은 이곳이 서울 내의 명승(名勝)이기도 했으나 김상용이 1627년 정묘호란 때는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서 서울을 지켰으며, 1636년 병자호란 때 묘사(廟社)의 신주를 받들고 빈궁 · 원손을 수행해 강화도에 피난했다가 이듬해 성이 함락되자 성의 남문루(南門樓)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殉節)한 충신(忠臣)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늠연사에 모셔진 김상용의 초상을 참배하기 위해 이 청풍계를 찾았고, 겸재 정선도 이러한 충신의 혼이 머무는 명승을 여러 차례 그린 것으로 짐작했다.
경기도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기증 유물은 김상용의 생애, 선조의 어필이라는 정치사적 가치,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라는 예술사적 성과가 담겨 있는 귀중한 자료”라며, “단순한 유물의 이전을 넘어 우리 역사와 문화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뜻깊은 계기로, 조선시대 정치·문화·예술을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귀한 뜻으로 유물을 기증해 주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중한 유산을 잘 보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